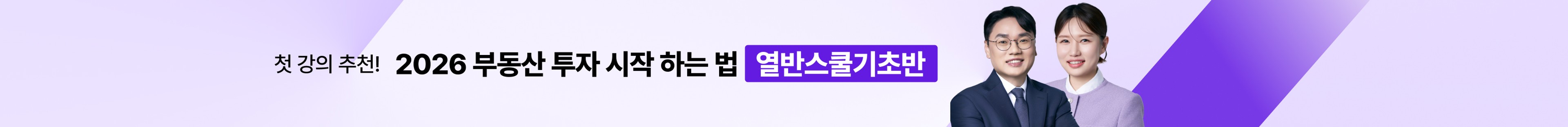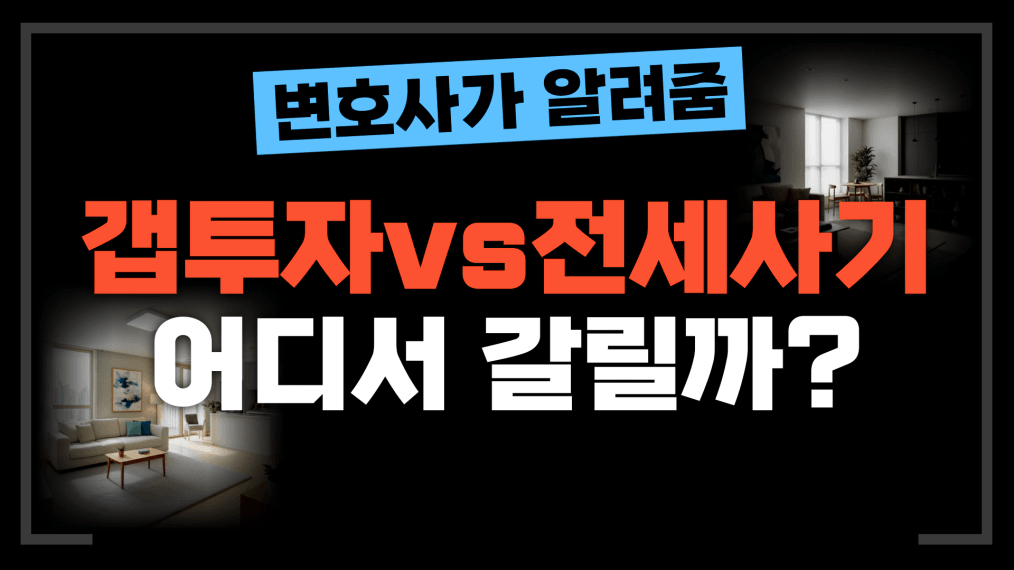
“갭투자 VS 전세사기
그 위험한 경계…”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 조효동입니다.
최근 부동산 분쟁을 보다 보면, 이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나도 그냥 남들처럼 투자한 건데 왜 사기범이 되느냐’ 억울할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선 ‘애초에 보증금 못 돌려줄 구조였던 거 아니냐’ 반박하게 되죠.
오늘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경우를 ‘정상적인 갭투자’로 보고, 어떤 경우를 ‘전세사기’로 판단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적인 갭투자 vs 무자본 갭투자
- 정상적인 갭투자란, 집값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차액을 투자자가 자기 돈으로 메우고,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현금, 대출, 기타 자산 등)을 갖춘 구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고요.
- 반대로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은 ‘깡통’이 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크게 흔들어놓았던 대부분의 전세사기 수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잔금을 받은 다음 날, 또는 잔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자마자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 법원이 사기라고 보는 이유
기망행위(묵비 포함)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면 ‘기망’으로 봅니다. 예컨대,
- 임대인이 사실상 무자본 매수인이라는 점
- 내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로 쓰인다는 점
- ex) 보증금을 분양사, 시공사 등에 매매잔금으로 치루는 경우
- 리베이트로 실질 매매가가 낮아져 있다는 점
- 계약 직후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넘어간다는 점
이런 걸 알았다면 세입자가 절대 계약 안 했을 테니, 숨긴 것 자체가 기망에 해당합니다.
편취의 범의(미필적 고의)
“부동산 오르면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어찌 되겠지’ 하고 밀어붙였다면, 그 자체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구조적 위험성·반복성
- 수십 채를 무자본으로 한꺼번에 매집
-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
- 세금이나 유지비는 감당할 계획조차 없음
- 담보가치 부족으로 강제집행 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법원은 ‘처음부터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보고 사기로 판단합니다.
3) 요약 표로 보는 차이점
| 구분 | 정상적 갭투자 | 전세사기 위험구조 |
|---|---|---|
| 자기자본 | 있음 (차액 직접 투입) | 없음 (0원) |
| 매수 재원 | 자기 돈+대출 | 세입자 보증금 |
| 보증금 반환 | 자체 자산·소득으로 가능 | 돌려막기 전제, 능력 없음 |
| 거래 절차 | 일반 절차, 정보 공개 | 임대차·매매 동시진행, 숨김 |
| 리베이트 | 없음 | 있음, 실매매가 하락 |
| 소유권 이전 | 정상 매수인 | 무자력자에게 이전 |
| 법적 평가 | 합법적 투자 |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음, 실명법 위반 위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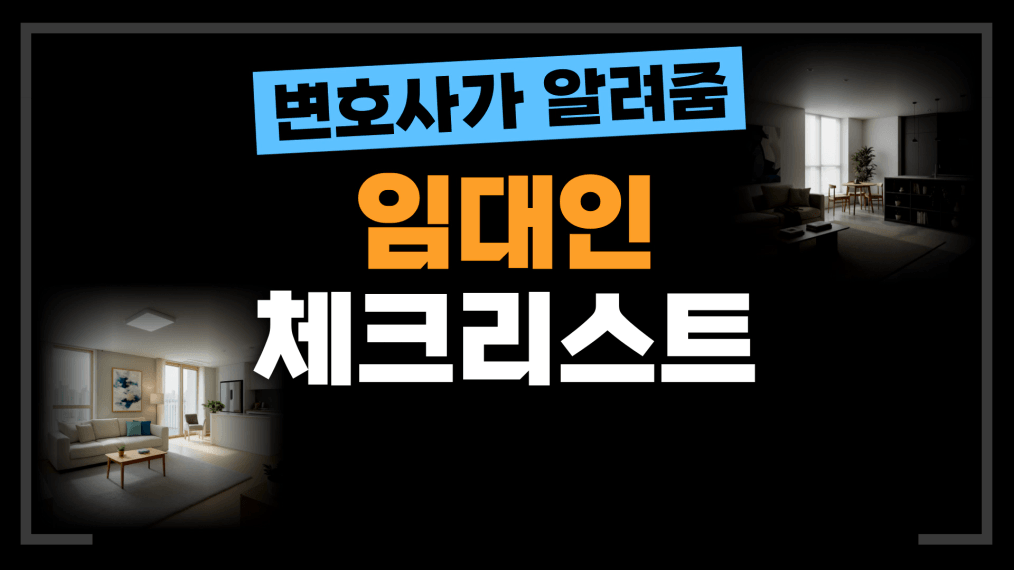
4) 임대인(투자자) 체크리스트
- 자기자본 반드시 투입하세요. “0원 투자”는 위험합니다.
- 보증금 돌려줄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두세요. (현금, 대출한도, 다른 자산 등)
- 임대차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지 마세요.
- 분양사, 시공사 등에게 리베이트나 사례비를 받는 구조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세입자에게 구조, 위험, 소유권 이전 일정까지 투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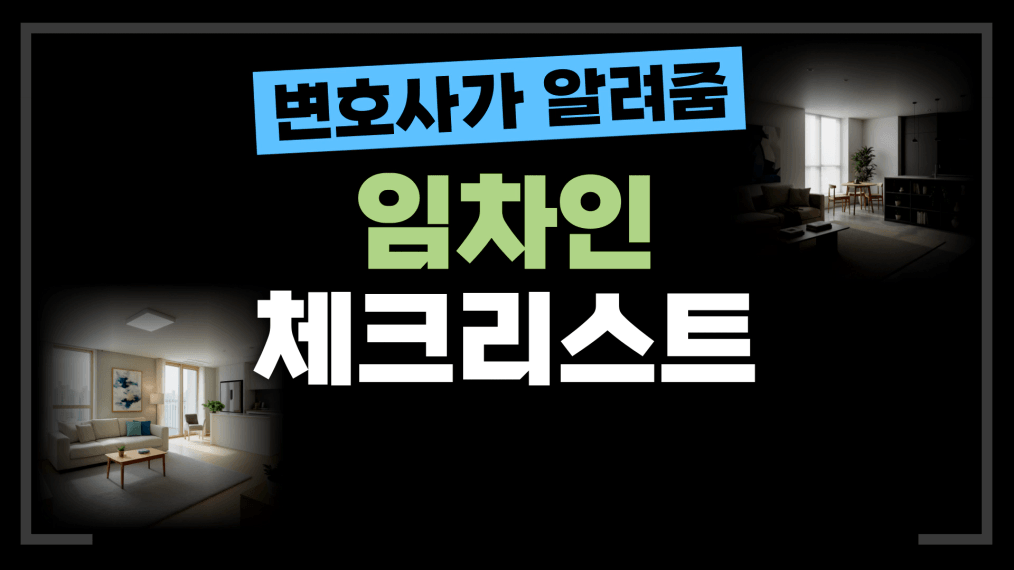
5) 임차인(세입자) 체크리스트
-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내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쓰이는지, 반드시 질문하고 기록 남기세요.
- 보증금은 ‘전입신고 후 다음 날 지급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잔금을 입금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임대인 변경 시 새 임대인의 자력 증빙을 확인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 조항을 넣으세요.
- 되도록이면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세요.
- “무자본으로 집주인 가능하다”, “보증금이 곧 매매대금이다” 같은 말이 나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6) 공범·실명법 책임도 주의
-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구조를 알고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 컨설팅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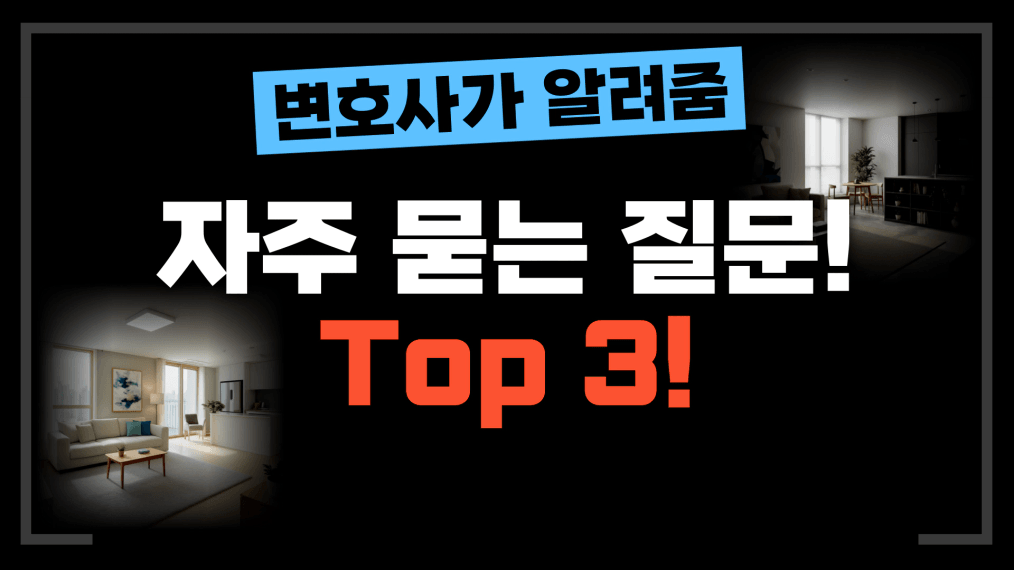
7) 자주 나오는 오해
Q. 세입자가 깡통전세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고 계약했다면, 사기는 아닌 거죠?
A. 아닙니다. 담보 부족 위험을 막연히 알았다고 해서 임대인의 무자본 구조까지 용인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Q. 보증보험 들어놨고, 결국 보험금으로 세입자가 돈을 받았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적 자금이 들어가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Q. 나는 시키는 대로 서류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무죄 아닌가요?
A. 반복적으로 참여했고 구조를 알 수 있는 위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상적인 갭투자는 자기 돈을 넣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투자입니다.
반면 전세사기는 남의 돈(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애초에 돌려줄 방법도 없는 구조를 숨기는 경우입니다.
투자자는 ‘합법 체크리스트’를 지키면서 불법 신호가 보이면 바로 중단해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안전장치’를 통해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갭투자와 전세사기의 경계는 투명성과 보증금 반환능력에 있습니다.
투자라면 숨길 게 없어야 합니다. 계약 구조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만기 때 돈을 돌려줄 능력이 준비돼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수익보다 중요한 건, 남의 보증금이라는 ‘삶의 안전망’을 지켜주는 겁니다. 합법적인 투자냐, 범죄냐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