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내식당, 식판 위에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밥말생 #3
워런 버핏에게 배운 -80%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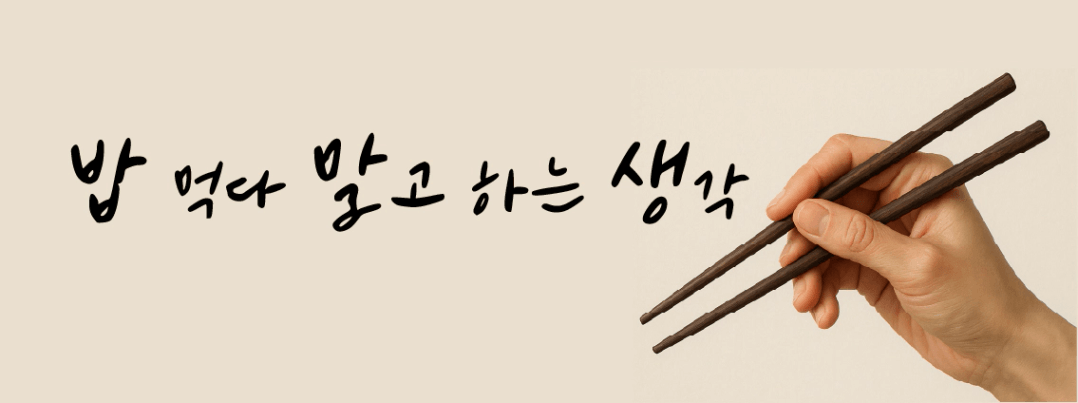
때는 2021년
점심시간이었다.
오늘의 메뉴는 알탕
국물은 얼큰했고, 탕 속엔 알보다 말이 더 많았다.
식판에 밥을 툭 올려놓자마자
김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알트코인 대세인데, 박과장은 뭐 안 해요?”
옆자리 실장님도 한 숟갈 얹으셨다.
“내 후배는 그걸로 6천 벌었다더라!
벤츠 샀대~ 허허허”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조용히 멈췄다.
국물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웠다.
왜냐고?
그때… 나도 리플 샀다.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리플, 리플레이
‘이건 다시 간다… 4천!’
근거는 없었지만 느낌은 꽤 강렬했다.
나는 야수의 심장으로
모아둔 종잣돈을 넣었다.
그때 가격은 2천원
🥄
그리고 4년간 리플은
동전이 됐다.

-80%
그게 꿈이었는지 헷갈릴 무렵
나는 자주 혼잣말을 했다.
“이건 장투야…”
더 큰 문제는
네이버 로그인도 겨우 하시던 우리 아버지였다.
친구분이 이건 무조건 번다며 권했고,
아버지는 모아둔 용돈을 비트코인에 넣으셨다.
결과는 뻔했다
어르신 대상 교육을 하던 거래소는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다.
로그인이 안 되던 그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해
내 손으로 번 게 최고야”
그 말이
알탕 국물보다 더 뜨거웠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모르는 곳엔 다시는 돈 넣지 말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
전세가율이 뭔지,
실거래가와 호가는 어떻게 다른지,
세 낀 매매는 뭔지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어가며 공부했다.
막연했던 투자의 세계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
최근 읽은 워런 버핏 삶의 원칙에선
이런 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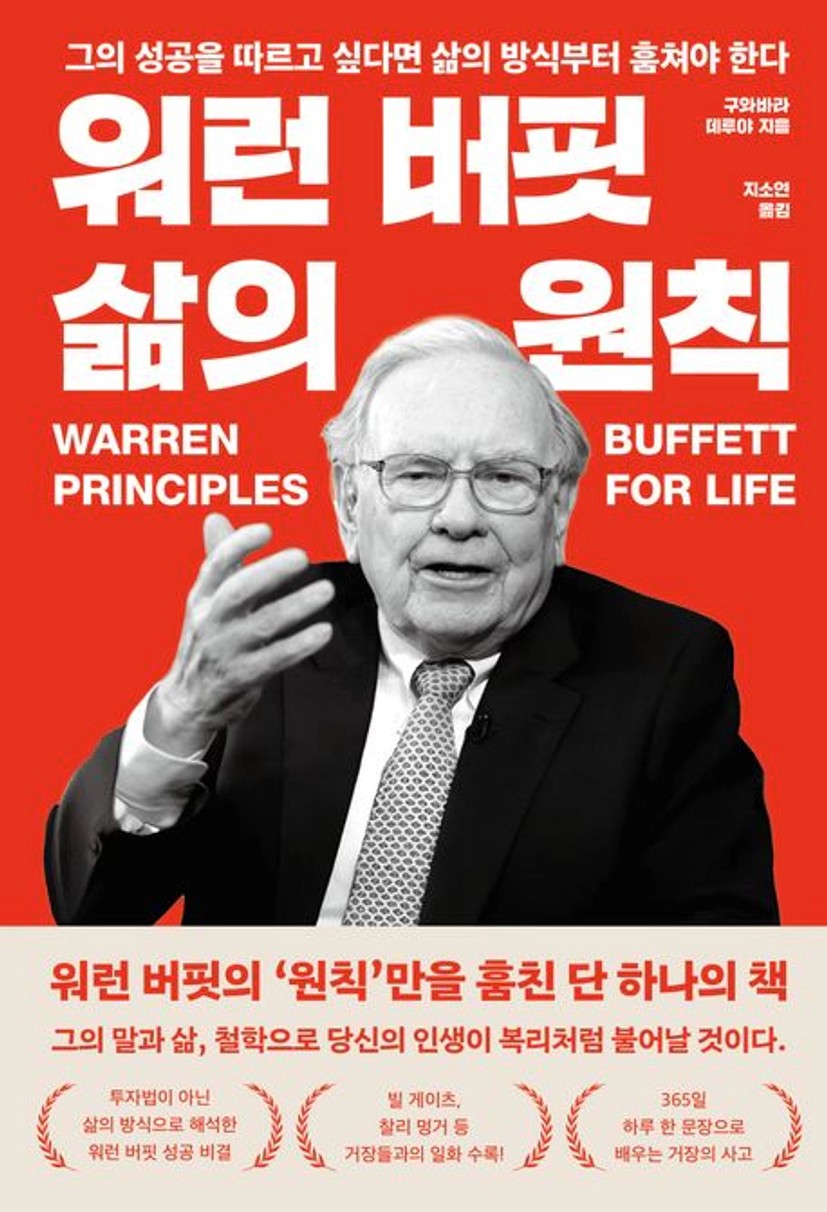
“아무 생각 없이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돈을 거는 사람이 없는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는 그 아무 생각 없는 참가자 중 하나였다
“조금 더 높은 이익을 내겠다고 유행에 편승하고 싶진 않습니다”
→ 알트코인이 대세라는 이유만으로 따라갔던 나
“다른 사람들이 욕심 낼 때는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욕심을 내라”
→ 욕심이 앞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시절
김대리는 여전히 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국물에 밥을 말았다.
점심 끝 무렵, 실장님이 물으셨다.
“박과장은 안 들어가나?
요즘 또 간다던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사실 4년 만에 내가 샀던 가격까지 회복됐을 때
조용히 매도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리플은 정말 4천을 갔다
아쉽지는 않다)
그리고 생각했다.
‘인플레이션 비용은 치뤘지만 잘 배웠다'
코인이 다시 올랐는지 몰라도
나는 그때의 나를 리플레이하진 않기로 했다.
그때의 나는
모르면서 욕심낸 나였다면
지금의 나는 배워서 기다릴 줄 아는 나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나 박과장은
유행이 아닌 기준을 좇는다
밥말생 3부 끝

